一手獨拍, 雖疾無聲
拍掌大笑(박장대소)는 손바닥을 치며 크게 웃는 것이다. 음악의 마디인 拍子(박자)를 가리키기도 한다. 拍板(박판)은 가락을 맞추는 나무판이고, 拍車(박차)는 말을 탈 때 신는 구두 뒤축에 다는 톱니 모양의 물건으로 말의 배를 차서 빨리 달리게 하는 장치이다.
雖(수)는 양보를 표시하며 ‘비록∼하더라도’에 해당한다. 원래는 도마뱀과 유사한 벌레를 가리키는 글자인데, 그 본뜻은 오히려 드물게 쓰인다. 疾(질)은 질병이나 고통의 뜻 외에 疾風(질풍)이나 疾走(질주)처럼 빠르다는 뜻도 있다. 그 뜻이 모두 矢(시), 즉 화살과 관련이 있다.
無(무)는 춤, 즉 舞(무)의 본래 글자라는 설과 숲이 우거진 것을 나타낸 것이라는 설이 있다. 없다는 뜻은 후에 부가되었다. 聲(성)은 소리나 명성을 뜻한다. 윗부분은 옛 악기인 경석, 즉 磬(경)의 원래 형태이고 아래의 耳(이)는 듣는 것을 나타냈다.
한쪽 손바닥으로는 소리내기 어렵다며 孤掌難鳴(고장난명)이라고도 한다.
一粒粟中藏世界, 半升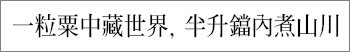
半(반)은 八(팔)과 牛(우)를 합해 소의 분해를 나타냈다. 절반이라는 뜻 외에 夜半(야반)에서처럼 중간의 뜻으로 확대되었다
鐺
작은 곡식 한 알과 그릇 하나에도 세상천지의 모든 이치가 담겨 있다고 한다. 다만 지극한 慧眼(혜안)이 있어야만 여러 각도에서 그 오묘한 이치를 탐구할 수 있다. 꽃가지 하나와 흙 한 줌에서 세상 이치를 깨닫는 것은 깊은 사색에서 얻어진 통찰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王良登車, 馬不罷駑
王良(왕량)은 춘추시대에 말을 잘 몰기로 이름난 사람으로 造父(조보)와 짝이 된다. 또 말을 잘 알아본 사람으로 伯樂(백락)과 짝이 되기도 한다. 말의 활용과 감정 모두에 능했다면 조보와 백락의 능력을 겸비한 것이다.
罷駑(피노)는 지치고 둔하다는 뜻이다. 자신을 지치고 둔한 말로 비유하는 겸손한 말로도 쓰인다.
훌륭한 수레몰이는 말이 지치고 힘들게 하지 않는다. 능력 발휘의 최적 조건을 갖춰주어 최대 성과를 내게 하며 그 공을 차지한다. 그러려면 알맞은 수레를 끌려 정확한 길로 이끄는 일 외에, 말의 능력에 맞춰 최대로 발휘시키는 일 또한 핵심사항이다.
一犬吠形, 百犬吠聲
吠(폐)는 개 또는 동물이 짖다 또는 욕설로 비난하다의 뜻이다. 吠日(폐일)은 해를 보고 짖는 것으로 견식이 좁은 이가 당연한 것을 보고 신기하게 여겨 떠드는 것을 비유한다. 犬吠之警(견폐지경)은 개가 짖는 정도의 경계로 대수롭지 않은 소란을 비유한다.
形(형)은 형체나 모습 또는 형세나 정황을 뜻한다. 실체나 육체를 뜻하기도 한다. 形名(형명)은 사물의 실재와 명칭을, 形影(형영)은 형체와 그림자를, 形神(형신)은 육체와 정신을 뜻한다.
개 한 마리가 짖으면 다른 개들도 덩달아 짖어댄다. 荒唐(황당)한 유언비어, 附和雷同(부화뇌동)은 남에게 악용되기도 한다.
何嘗見明鏡疲於屢照
疲馬不畏鞭箠(피마불외편추)는 지친 말은 채찍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피폐한 국민은 형벌도 두려워하지 않음을 비유한다.
於(어)는 장소나 때를 표시하는 외에 원인이나 배경을 표시하기도 한다. 屢(루)는 屢次(누차)처럼 여러 번 또는 번거롭다는 뜻이다. 照(조)는 비추다 또는 비추어보다의 뜻이다. 照鏡(조경)은 거울에 비추어보다의 뜻이다. 對照(대조)처럼 맞추어보다의 뜻도 있다. 여기의 屢照(누조)는 여러 차례의 질문을 의미한다.
학습하는 장소에서 누군가가 옆 사람에게 말했다. 선생님께 자꾸 여쭤보자니 괴롭히는 것 같고, 가만히 있자니 좋은 말씀을 놓칠 것 같다고. 그 옆 사람은 걱정 말라며 말했다. “맑은 거울이 여러 번 비춰본다고 피곤해하거나, 맑은 강이 산들바람을 싫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소?”
가르치는 이는 배우는 이의 물음을 싫어하기보다는 오히려 환영한다. 물음은 배움의 진지함을 나타내며 가르쳐야 할 것을 잘 알려주기 때문이다. 또 물음은 가르치는 이가 부족함을 깨닫고 스스로 발전하게도 한다. 그래서 敎學相長(교학상장), 즉 배우고 가르치며 서로 발전한다고 한다.